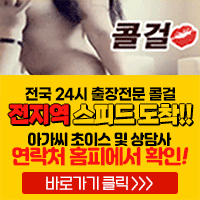엘리베이터 썰을 보고 떠올린 과거 이야기
2006년, 아니면 2007년. 또는 2008년.
그 즈음이었던 것 같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우리는 단합이라는 핑계로
근처 저수지나 대학교 잔디밭에서 술을 먹기 일쑤였다.
자연스럽게도,
대학과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들 집에서
간단한 주전부리나 종이컵, 젓가락 또는 담금주 등을 챙겨가는 경우가 많았다.
언니나 형의 민증으로 수퍼에 가서
종이컵, 젓가락을 사거나 담배를 종류별로 산다면 미성년자 티가 나지 않을까 하고
술과 과자 따위만 잔뜩 사오곤 했다. 나름 제딴에는 머리를 굴리는 것이었다.
-물론 대학에 가고나서 그런 행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내 친구의 집은 대학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다.
당연스럽게도, 그 친구의 집에 들러 무언가 챙겨가는 경우가 많았다.
아버지의 산삼주라던가, 이모가 보내주신 복분자라던가, 하다못해 곶감 나부랭이도 서로 나눠먹을 때였다.
그렇게 약탈을 마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였다.
친구의 집은 23층.
지어진 지 꽤나 오래된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내가 느끼기에도 꽤나 느렸다.
크엉, 덜컹 같은 소리가 연신 들려온다.
띵-
문이 닫혔다.
'1층'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우리의 목적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은색의 문과 마주한 벽에는 게시판이 걸려있고, 양쪽에는 커다란 거울이 붙어있다. 그 아래로 피아노 학원, 치킨 가게 따위의 광고가 길게 붙어있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야. 그거 알아?"
몇 가닥 자라기 시작한 턱수염을 만지작 거리며 친구가 말했다.
"저 거울 말이야."
"뭐?"
"저거."
친구의 손끝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묘한 표정의 내가 그의 손가락을 보고있다.
그 뒷모습, 묘한 표정, 그 뒷모습, 묘한 표정, 그 뒷모습, 묘한 표정..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이 끝없이 이어지다 새까만 구멍으로 빨려들어간다.
"그런 말 있잖아."
친구가 말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 안 된대. 열 세번째 모습이 제멋대로 움직인다고.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인 너를 죽이러 온다는 거지. 자기가 진짜가 되려고."
"지랄하지마."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일곱살, 여덟살 짜리 아이도 아니고 이제 곧 성년이 될 나이에 이런 소리가 가당키나한가.
"너같은 새끼들 때문에 분신사바니 뭐니 그런게 안끝나는거 아냐."
나는 오른손을 들었다. 거울 속 수많은 내가 똑같이 손가락을 들어 우리를 가리켰다.
"새끼야, 내가 보여줄게. 뭐? 열 세번째?"
퉁명스러운 말을 내뱉은 나는 천천히 거울 속의 나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잘 보이지 않는다.
배경은 점점 어두워지고 거울에 비친 내 낯빛도 어두워졌다.
"넷, 다섯."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여섯, 일곱."
접었던 손가락을 다시금 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위 화면을 흘긋 바라보았다. 붉은 숫자는 아직도 16층을 가리킨다.
"일곱, 아니 여덟. 아홉.."
우측으로 죽 늘어선 여덟번째 나의 얼굴을 예상하며 생각했다.
열 세번째의 나를 볼 수는 없겠구나.
이래서 열 세번째를 보지 말라는 얘기였군.
볼 수가 없으니까.
눈동자를 굴려 친구를 바라보았다.
"야."
나의 부름에도 친구는 말이 없다.
"열 세번이고 지랄이고 보이지가 않는구만."
친구는 내 말이 들리지 않는 듯
은색으로 빛나는 승강기 문을 홀린 듯 바라보고 있었다.
"야!"
"응애!!"
나의 부름에 대답한 것은 아이의 울음 소리였다.
그 소리는 너무나 선명했기에 목덜미의 털이 순간 곤두서는것이 느껴졌다.
공기가 차갑다.,
나만의 착각이 아니다.
내 눈앞의 친구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응애!"
검은 화면에 뜬 붉은 숫자는 아직 9를 가리키고 있다.
'시발. 왜이렇게 느린..;
"응애!"
귓가에서 아이의 소리가 들려왔다. 파리를 쫓듯 오른팔을 거칠게 휘두른 탓에 거울에 부딪혔다. 새끼손가락에서 둔중한 통증이 느껴진다.
"응애!!"
내 왼쪽 뺨 옆에 무언가 있다. 숨결, 온기가 느껴진다. 으응,,하는 작은 읊조림마저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이게 내 몸에 닿으면 뭔가 큰 일이 날 것 같다. 아니. 큰 일이 날 것이다.
"띵-"
명랑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다.
가벼운 쇳덩이가 열리며 보인 것은 포대기에 둘둘 말린 아기다.
"응애!"
내 옆에서 무언가가 튕기듯 달려나간다.
검정석 나이키 코르테즈를 보고나서야, 그것이 23층에 사는 내 친구임을 깨달았다.
나 또한 헉, 하는 신음을 내뱉고 튀어나갔다.
아이를 안은 아주머니가 미친놈을 보듯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그런건 중요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와 아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지상최대의 목표였다.
유리문이 깨지든 말든 상관않고 거칠게 밀어젖히자 시원한 바람이 훅 불어온다.
귓가에 맴돌던 '응애'소리도 함께 씻겨 나간 것 같다.
그제야 친구가 생각났다.
"이새끼 어디간거야."
저 멀리, 재활용 쓰레기장 옆 흡연 구역이 보인다. 이웃들이 볼까봐 숨어서 담배를 피운다던 그 친구는
벌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뻐끔뻐금 담배를 피우고 있다.
"야, 이새끼야."
친구의 얼굴을 보자 긴장이 풀리는 나였다.
"쇼를 해도 좀 리얼하게 해야지. 연기가 그게 뭐야."
나의 목소리에 그가 튕기듯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나의 허리와 등, 목덜미를 연신 털어대기 시작했다.
"왜그래?"
내가 물었지만 그는 아랑곳 하지 않고는 어깨를 두들겨댔다.
그의 표정에 평소 보이던 장난기 어린 분위기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왜 그러는데 새끼야."
"너."
깊게 빨아들인 담배연기를 뿜으며 친구가 말했다.
"아까 못 봤어?"
"뭘?"
"엘리베이터 말야."
"열 세 번째 그거?"
"그래."
친구가 침을 꿀꺽 삼켰다.
"너 손가락 접었지."
"응."
내 말에 친구가 몸서리를 쳤다. 바짝 쳐 올린 뒷머리가 비쭉 솟아오르는 것이 눈에 보인다.
"니가 손가락을 접고 펼때마다 거울 속 한 명이 손가락을 반대로 하더라."
그 이후 나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다.
스물 세 개의 층을 천천히 걸어 갈 뿐이다.
응애, 응애.
지금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오른쪽 어깨가 괜히 무겁다